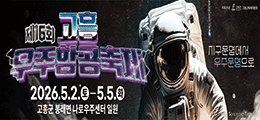[박성남 광주지법 판사]아빠들의 육아휴직
자신을 닮은 2세의 탄생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다. 하지만 육아는 그러한 기쁨의 연장이면서도 “밭 맬래? 애 볼래? 하면 밭을 매러 간다”는 옛말도 있듯이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일이기도 하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늘고 있는 요즘 일을 하면서 육아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쌍둥이를 둔 아빠이면서 부끄럽게도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육아를 분담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그로 인한 부담은 필자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아내와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황혼육아의 굴레를 쓰게 되신 어머니에게 고스란히 넘어갔다.
그런 필자에게도 육아의 어려움을 실감하게 된 계기가 있었으니 바로 육아휴직이다. 쌍둥이가 17개월에 접어들 무렵부터 오직 육아만을 위해 1년간 휴직을 했다. 육아와 집안일을 전담하면서 일하는 아내의 외조도 하는 전천후 다기능 가장이 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안고 휴직을 했으나 그 포부의 실현이 쉽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외조는커녕 번갈아 치는 쌍둥이의 저지레를 수습하기에도 벅찬 하루하루였다.
쌍둥이의 탄생과 악화되는 어머니의 허리병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육아휴직이기는 했지만, 육아휴직을 결정하기까지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혹여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직장생활에서 불이익을 입게 되지는 않을지, 1년이라는 공백이 두뇌회전의 감퇴를 한층 더 가속화시키지는 않을지 등등.
그러나 육아는 현실이었다. 육아휴직 후의 매일은 온전히 꽉 찬 하루였다. 쌍둥이가 낮잠을 동시에 자야만 간신히 얻을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에 육아휴직의 불이익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것은 막간의 자유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
육아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노동이었다. 그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하였다. 가계 경제가 걱정될 정도로 인터넷 쇼핑하기, 체중이 걱정될 정도로 초코파이 폭식하기, 노년이 걱정될 정도로 아내에게 바가지 긁기 등등. 일신의 평안을 갈구하던 그때 오직 제목 하나만 보고 인터넷 최저가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과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구입해 읽기도 했지만, 애석하게도 그 책들은 그다지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그야말로 사춘기 때도 겪어보지 못했던 질풍노도의 시기였다.
최근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경험해 봐서 안다. 평일 오후 유모차를 밀며 동네를 배회하면서 ‘나를 한심한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의 기우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남성이 주도하는 육아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 분위기도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남성의 육아휴직에 육아 이외의 다른 목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선입견 또한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 같다. 남성의 육아휴직도 엄연히 법으로 인정되는 권리임에도 권리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앞서 육아휴직의 고충만을 나열했으나 그 기간 동안 사랑하는 쌍둥이의 커가는 모습을 빠짐없이 지켜보면서 쌍둥이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유대감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큰 수확이었다. 그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그때 육아휴직을 선택한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했을 때 법원 가족들이 필자에게 건넨 고생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육아휴직 전에 했던 고민들이 헛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남성이 떳떳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서툴지만 육아에 전념하고 있을 전국의 남성 육아휴직 전우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쌍둥이를 둔 아빠이면서 부끄럽게도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육아를 분담하는 데 소극적이었다. 그로 인한 부담은 필자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아내와 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황혼육아의 굴레를 쓰게 되신 어머니에게 고스란히 넘어갔다.
그러나 육아는 현실이었다. 육아휴직 후의 매일은 온전히 꽉 찬 하루였다. 쌍둥이가 낮잠을 동시에 자야만 간신히 얻을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에 육아휴직의 불이익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것은 막간의 자유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
육아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노동이었다. 그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하였다. 가계 경제가 걱정될 정도로 인터넷 쇼핑하기, 체중이 걱정될 정도로 초코파이 폭식하기, 노년이 걱정될 정도로 아내에게 바가지 긁기 등등. 일신의 평안을 갈구하던 그때 오직 제목 하나만 보고 인터넷 최저가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과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구입해 읽기도 했지만, 애석하게도 그 책들은 그다지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그야말로 사춘기 때도 겪어보지 못했던 질풍노도의 시기였다.
최근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경험해 봐서 안다. 평일 오후 유모차를 밀며 동네를 배회하면서 ‘나를 한심한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의 기우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남성이 주도하는 육아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 분위기도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남성의 육아휴직에 육아 이외의 다른 목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선입견 또한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 같다. 남성의 육아휴직도 엄연히 법으로 인정되는 권리임에도 권리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앞서 육아휴직의 고충만을 나열했으나 그 기간 동안 사랑하는 쌍둥이의 커가는 모습을 빠짐없이 지켜보면서 쌍둥이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유대감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큰 수확이었다. 그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그때 육아휴직을 선택한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했을 때 법원 가족들이 필자에게 건넨 고생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육아휴직 전에 했던 고민들이 헛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남성이 떳떳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서툴지만 육아에 전념하고 있을 전국의 남성 육아휴직 전우들에게 경의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