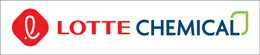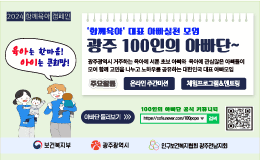‘서울의 봄’이 광주시민들에게 남다른 이유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한 ‘서울의 봄’이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2일 개봉한 ‘서울의 봄’은 개봉 4일째 100만 명을 동원한 데 이어 개봉 12일을 맞은 3일 400만 명의 관객을 돌파하며 승승장구하는 중이다. 광주에서도 지난 2일까지 94개 스크린에서 누적 관객수 14만 5200명을 기록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극장가는 이런 흥행 추세라면 천만 영화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12·12 군사반란의 긴박했던 9시간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서울의 봄’은 특히 광주시민들에게는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신군부 세력이 주도한 12·12 군사쿠데타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전두환이 광주시민을 학살하는 5·18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전두환이 반란을 일으키고 정권을 찬탈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를 보며 분노하고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영화를 통해 새롭게 조명된 인물도 있다. 육군본부 B-2벙커를 지키다 사망한 조민범 병장의 모티브가 된 광주 출신 고(故) 정선엽 병장이다. 국방부 제50헌병 중대 소속이었던 그는 무력 진압에 나선 반란군에 끝까지 저항하다 목숨을 잃었지만 전사자로 인정받지 못하다 지난해에야 전사자로 결정됐다.
‘서울의 봄’은 10대부터 노년층까지 전 연령층에서 고루 호평을 받고 있다. 분노와 스트레스 지수를 공유하는 ‘심박수 챌린지’까지 유행할 정도로 편하게만 관람할 수 있는 작품은 아니지만, 역사적 사실을 파악한 후 N차 관람하는 사람도 많다. 무엇보다 당시 상황을 경험하지 못한 MZ세대 사이에서 12·12를 비롯한 한국 현대사를 다시 공부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영화 ‘서울의 봄’은 있어서는 안될 비극적인 현대사를 우리 앞에 보여줬다.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
영화를 통해 새롭게 조명된 인물도 있다. 육군본부 B-2벙커를 지키다 사망한 조민범 병장의 모티브가 된 광주 출신 고(故) 정선엽 병장이다. 국방부 제50헌병 중대 소속이었던 그는 무력 진압에 나선 반란군에 끝까지 저항하다 목숨을 잃었지만 전사자로 인정받지 못하다 지난해에야 전사자로 결정됐다.
영화 ‘서울의 봄’은 있어서는 안될 비극적인 현대사를 우리 앞에 보여줬다.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