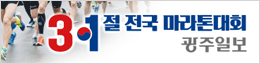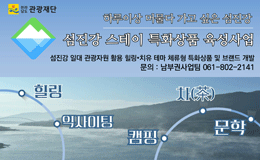[수필의 향기] 밤, 10시 45분 - 박용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
10시는 내 삶의 점호시간이다. 바둑을 두다가 마지막 착점을 하거나 읽던 책을 접는 시간이다. 누구를 만나면 마지막 술잔을 드는 때이기도 하다. 군대처럼 서둘러 동작 그만, 하루를 마무리한다.
30여 분이 지나면 자리를 펴고 나를 눕힌다. ㅣ의 몸을 ㅡ로 바꾼다. 마치 초병처럼 꼿꼿했던 몸도 마음도 ㅡ처럼 야들야들 늘어진다.
그리고 45분, 익숙한 어둠 속으로 내 몸을 감춘다. 나는 없다. 어둠에 나를 내어 준다. 내가 없음으로써 가장 편안한 내가 되고, 나를 지움으로써 나는 비로소 또 다른 자유로 태어난다. 나를 눕히고 내려놓는 일이 이리 간단하고 쉽다니, 애면글면 산 오늘을 되돌아본다.
두 눈을 어리마리 감는다. 그러면 비로소 보인다. 오늘 읽었던 책 줄거리와 바둑의 맥점, 술자리에서 했던 친구의 진의, 그렇게 내 영혼의 무늬에 중량을 더하고, 예쁜 결 하나 새긴다.
그렇게 복기하고 홀로 2차를 마시며 바지런히 오늘을 퇴고한다. 천장의 자음과 모음을 선택해서 글따구니를 잡고 새 옷을 입히고 새롭게 숨을 불어넣는다. 글은 내가 쓰지만, 오늘 하루가 쓰고, 지금까지 쌓인 나날들이 쓴다. 또 그 글들이 나를 만들어 간다.
낡은 썰물을 보내고 새 밀물을 맞이한다. 이성을 비우고 감성을 채운다. 오늘 거둔 많은 낟알을 고운 채에 걸러 알곡 낱알을 마음 곳간에 채운다.
봄밤, 꽃은 바삐 벙글거나 너르듣는 때이고, 여름은 먼 곳에 소쩍새 울음소리가 파고드는 시간이다. 가을 이 시간은 풀벌레들이 그악스럽게 떠드는 즈음이다. 그들 이야기에 잠시 귀를 기울인다. 도시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기꺼이 그들 틈에 합석하여 잠시 수다를 떤다. 즐겁다고, 오늘 약 챙겨 먹었느냐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미움을 덜어내고 사랑을 충전하는 45분, 뼈조차 비어서 시린 시간이라서 영혼까지 가벼워진다.
수필이 여느 글과 다르다면 그것은 통념을 흔들거나, 엇나가 새로움을 찾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운동회 달리기에서 1등을 하고 부자가 되어서 행복했다면, 수필가는 꼴찌하고 가난해도 행복하다는 반전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소설가는 청군 백군의 경쟁을 통해 운동회 전체를 보여주고, 시인은 특정 선수, 한 사람의 단면을 통해 운동회 맛깔을 낸다면, 수필가는 엇나가서 운동장도 선수도 아닌 그 무엇을 통해, 그날 그 순간의 짜릿한 감동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넘어졌지만 누군가를 웃겼거나 누구의 도움을 받아 행복한, 꼴찌지만 결코 꼴찌가 아니라고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사유가 있어야 한다. 김치찌개가 맛있는 이유가 좋은 재료 덕만이 아닌 농부의 정성, 식당 아주머니의 손맛, 나아가 그날 날씨 하나까지 읽어내는 눈이 있어야 한다. 눈을 뜨고 누구나 보면서도 보지 못한 부분을 콕 잡아내는 안목, 독특하고 특이해서가 아닌 누구나 알면서 깨닫지 못한 부분을 이르집어 주는 글, 사유의 힘이 있어야 한다.
수필 쓰는 일은 그 해 추수라기보다 매일매일 이삭을 줍는 일이다. 구석구석 이삭을 줍듯 하루를 살피고, 아픈 부분을 찾아내서 약을 발라주는 세심함과 따뜻함이 필요한 일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사이 나는 잠이 든다. 내 글들은 내가 자는 동안 보골보골 숙성되어 아침을 맞이하면 잘 익어있다.
구슬을 꿰는 밤 10시 45분, 나는 잠들고 내 수필은 지금 깨어나는 중이다.
30여 분이 지나면 자리를 펴고 나를 눕힌다. ㅣ의 몸을 ㅡ로 바꾼다. 마치 초병처럼 꼿꼿했던 몸도 마음도 ㅡ처럼 야들야들 늘어진다.
두 눈을 어리마리 감는다. 그러면 비로소 보인다. 오늘 읽었던 책 줄거리와 바둑의 맥점, 술자리에서 했던 친구의 진의, 그렇게 내 영혼의 무늬에 중량을 더하고, 예쁜 결 하나 새긴다.
그렇게 복기하고 홀로 2차를 마시며 바지런히 오늘을 퇴고한다. 천장의 자음과 모음을 선택해서 글따구니를 잡고 새 옷을 입히고 새롭게 숨을 불어넣는다. 글은 내가 쓰지만, 오늘 하루가 쓰고, 지금까지 쌓인 나날들이 쓴다. 또 그 글들이 나를 만들어 간다.
봄밤, 꽃은 바삐 벙글거나 너르듣는 때이고, 여름은 먼 곳에 소쩍새 울음소리가 파고드는 시간이다. 가을 이 시간은 풀벌레들이 그악스럽게 떠드는 즈음이다. 그들 이야기에 잠시 귀를 기울인다. 도시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기꺼이 그들 틈에 합석하여 잠시 수다를 떤다. 즐겁다고, 오늘 약 챙겨 먹었느냐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미움을 덜어내고 사랑을 충전하는 45분, 뼈조차 비어서 시린 시간이라서 영혼까지 가벼워진다.
수필이 여느 글과 다르다면 그것은 통념을 흔들거나, 엇나가 새로움을 찾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운동회 달리기에서 1등을 하고 부자가 되어서 행복했다면, 수필가는 꼴찌하고 가난해도 행복하다는 반전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소설가는 청군 백군의 경쟁을 통해 운동회 전체를 보여주고, 시인은 특정 선수, 한 사람의 단면을 통해 운동회 맛깔을 낸다면, 수필가는 엇나가서 운동장도 선수도 아닌 그 무엇을 통해, 그날 그 순간의 짜릿한 감동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넘어졌지만 누군가를 웃겼거나 누구의 도움을 받아 행복한, 꼴찌지만 결코 꼴찌가 아니라고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사유가 있어야 한다. 김치찌개가 맛있는 이유가 좋은 재료 덕만이 아닌 농부의 정성, 식당 아주머니의 손맛, 나아가 그날 날씨 하나까지 읽어내는 눈이 있어야 한다. 눈을 뜨고 누구나 보면서도 보지 못한 부분을 콕 잡아내는 안목, 독특하고 특이해서가 아닌 누구나 알면서 깨닫지 못한 부분을 이르집어 주는 글, 사유의 힘이 있어야 한다.
수필 쓰는 일은 그 해 추수라기보다 매일매일 이삭을 줍는 일이다. 구석구석 이삭을 줍듯 하루를 살피고, 아픈 부분을 찾아내서 약을 발라주는 세심함과 따뜻함이 필요한 일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사이 나는 잠이 든다. 내 글들은 내가 자는 동안 보골보골 숙성되어 아침을 맞이하면 잘 익어있다.
구슬을 꿰는 밤 10시 45분, 나는 잠들고 내 수필은 지금 깨어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