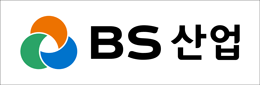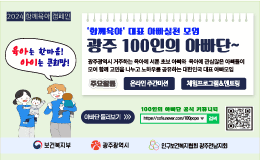[수필의 향기] 질주의 기억 - 김향남 수필가
 |
“빨리 오지 않고 뭐 하는 거얏? 전화 끊고 빨리 시동을 걸어, 시동을!”
수화기 저편에서 그녀가 소리쳤다. 선뜻 대답은 못 했으나 마음은 벌써 출발을 서두르고 있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가방을 챙겨 들었다. 순식간에 번복된 일이었다. 하지만 공연히 허전해 있는 나에게 왜 안 오느냐 빨리 시동을 걸어라, 냅다 후리는데 어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랴. 전화 너머 들려오는 말들과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 뭔지 모르게 들뜬 분위기도 나를 부추겼다. 접었던 날개가 다시 파닥거렸다. 이렇게 뭉그적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의 재촉대로 곧장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목적지까지는 무려 3시간 반을 달려야 하는 데다 날은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돌풍까지 몰아치고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한 것이 불과 몇 분 전인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처 달렸다. 고속도로에 접어들어서는 더욱 속도를 냈다. 질주 본능! 내 안의 숨은 본능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수억의 경쟁자들을 뚫고 전력 질주 끝에 얻어낸 목숨이지 않은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내 몸 어딘가에는 깊이 각인된 게 분명했다. 나는 바람처럼 씽씽 달렸다. 이 야밤의 질주 끝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산중의 절 하나와 아직 담소 중일 내 사랑하는 벗들이 등불 밝혀 마중해줄 것이다.
길은 적막하고 황량했다. 소리 없는 강물 같기도 하고 혹은 꿈틀대는 뱀 같기도 했다. 길은 외줄기만 있는 것도 아니어서 새끼 치듯 옆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다시 합쳐지고 나뉘면서 끝없이 이어졌다. 길은 어디로든 뻗어 나갔다. 산이건 들판이건 가리지 않았다. 도시건 시골이건 못 가는 곳도 없었다. 길은 어디서도 막힘이 없으며 누구라도 유혹할 수 있었다. 때론 구부러지고 때론 좁아지면서 살살 꼬리를 흔들기도 하고 희부윰한 안개 속에 그마저 감춰버리기도 했다. 길은 사람들을 불렀고 사람들은 너나없이 길을 찾아 떠났다. 때때로 길을 잃어 헤매기도 하고, 없는 길도 만들어 성공신화를 쓰기도 하였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밥벌이를 못한 채 백수로 지내던 때였다. 시간은 왜 그렇게 느리게만 가는지, 불안과 우울과 조급증에 몸살을 앓곤 했다. 하룻날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났다. 거두절미하고 나도 한번 달려보고 싶었다. 친구를 졸라 공사장 빈터로 갔다. 그곳에서 첫 교습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웬걸. 자세를 잡고 시동 거는 법도 배우고 어렵사리 막 움직여보려는 찰나, 그만 바닥에 곤두박이고 말았다. 출발도 하기 전 이마 위쪽을 일곱 바늘이나 꿰매는 큰 사고가 나고 말았으니, 그 무모했던 도전은 상처만 남긴 채 허망하게 끝나버렸다. 세상이 호락호락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덤으로 남기고서. 자전거도 잘 못 타는 주제에 감히 오토바이라니. 그 역시 함부로 넘봐서는 안 되는 물건이라는 것도!
그 후 다시는 어떤 것도 타지 못할 줄 알았다. 된통 얻어터지고선 자신감도 잃었다. 그러나 마음이라는 게 어디 그리 단단하기만 한가? 길치처럼 우왕좌왕 헤매기 일쑤지. 그런 중에 턱 하니 자동차가 나타났다. 사방이 휘휘 터진 ‘바퀴 둘 달린 것’보다야 훨씬 더 안정감도 있는 데다 ‘나만의 공간’ 같은 은근함도 갖추었거니와 거부할 까닭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윽고 내 두 다리는 가까운 주변이나 왕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방팔방 넓게 뚫린 몇 차선 대로, 저 먼 데까지도 무제한 확장되는 비약을 이루었다.
나는 꿈틀거리는 길의 꼬리를 따라 휙휙 달렸다. 휴게소에도 들르지 않고 오직 달렸다. 내가 차 안에 있다는 것도, 운전 중이라는 사실도 느껴지지 않았다.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것만 뿌듯하게 차오를 뿐. 앞에는 ‘자유의 깃발’ 같은 것이 환상처럼 펄럭였다. 목적지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었다. 좀 더 멀어도 좋고 아주 천천히 당도해도 좋을 듯 싶었다.
길은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면서 나의 질주를 받아 주었다. 나는 동굴인 듯 허공인 듯 무한히 열린 길을 따라 달리고 또 달렸다.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 같이’ 어느 고찰 향그러운 가슴들을 찾아가는 중이었다.
자전거 탄 청년 몇이 내 옆을 스쳐간다. 떨구고 간 바람 냄새가 ‘훅’ 하니 끼쳐온다. 풀숲에 든 새들이 푸드덕 날아오른다. 저 오래된 날들도 문득 눈앞엔 듯 다가와 선다. 좌충우돌 울퉁불퉁, 열망도 절망도 방방했던 날들…. 그때를 청춘이라 불러도 좋을까. 가을 오후 한적한 강변길. 멀어져간 자전거 뒤로 저릿한 기억 몇 낱 바퀴처럼 굴려 본다.
수화기 저편에서 그녀가 소리쳤다. 선뜻 대답은 못 했으나 마음은 벌써 출발을 서두르고 있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가방을 챙겨 들었다. 순식간에 번복된 일이었다. 하지만 공연히 허전해 있는 나에게 왜 안 오느냐 빨리 시동을 걸어라, 냅다 후리는데 어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랴. 전화 너머 들려오는 말들과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 뭔지 모르게 들뜬 분위기도 나를 부추겼다. 접었던 날개가 다시 파닥거렸다. 이렇게 뭉그적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밥벌이를 못한 채 백수로 지내던 때였다. 시간은 왜 그렇게 느리게만 가는지, 불안과 우울과 조급증에 몸살을 앓곤 했다. 하룻날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났다. 거두절미하고 나도 한번 달려보고 싶었다. 친구를 졸라 공사장 빈터로 갔다. 그곳에서 첫 교습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웬걸. 자세를 잡고 시동 거는 법도 배우고 어렵사리 막 움직여보려는 찰나, 그만 바닥에 곤두박이고 말았다. 출발도 하기 전 이마 위쪽을 일곱 바늘이나 꿰매는 큰 사고가 나고 말았으니, 그 무모했던 도전은 상처만 남긴 채 허망하게 끝나버렸다. 세상이 호락호락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덤으로 남기고서. 자전거도 잘 못 타는 주제에 감히 오토바이라니. 그 역시 함부로 넘봐서는 안 되는 물건이라는 것도!
그 후 다시는 어떤 것도 타지 못할 줄 알았다. 된통 얻어터지고선 자신감도 잃었다. 그러나 마음이라는 게 어디 그리 단단하기만 한가? 길치처럼 우왕좌왕 헤매기 일쑤지. 그런 중에 턱 하니 자동차가 나타났다. 사방이 휘휘 터진 ‘바퀴 둘 달린 것’보다야 훨씬 더 안정감도 있는 데다 ‘나만의 공간’ 같은 은근함도 갖추었거니와 거부할 까닭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윽고 내 두 다리는 가까운 주변이나 왕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방팔방 넓게 뚫린 몇 차선 대로, 저 먼 데까지도 무제한 확장되는 비약을 이루었다.
나는 꿈틀거리는 길의 꼬리를 따라 휙휙 달렸다. 휴게소에도 들르지 않고 오직 달렸다. 내가 차 안에 있다는 것도, 운전 중이라는 사실도 느껴지지 않았다.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것만 뿌듯하게 차오를 뿐. 앞에는 ‘자유의 깃발’ 같은 것이 환상처럼 펄럭였다. 목적지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었다. 좀 더 멀어도 좋고 아주 천천히 당도해도 좋을 듯 싶었다.
길은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면서 나의 질주를 받아 주었다. 나는 동굴인 듯 허공인 듯 무한히 열린 길을 따라 달리고 또 달렸다.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 같이’ 어느 고찰 향그러운 가슴들을 찾아가는 중이었다.
자전거 탄 청년 몇이 내 옆을 스쳐간다. 떨구고 간 바람 냄새가 ‘훅’ 하니 끼쳐온다. 풀숲에 든 새들이 푸드덕 날아오른다. 저 오래된 날들도 문득 눈앞엔 듯 다가와 선다. 좌충우돌 울퉁불퉁, 열망도 절망도 방방했던 날들…. 그때를 청춘이라 불러도 좋을까. 가을 오후 한적한 강변길. 멀어져간 자전거 뒤로 저릿한 기억 몇 낱 바퀴처럼 굴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