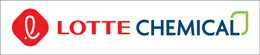[수필의 향기] 세상 끝에 있는 집- 박용수 수필가·동신여고 교사
 |
어머니를 모시고 나들이 나섰다. 부지런한 들판엔 개미처럼 풍성한 가을이 내려 앉았고, 베짱이처럼 느긋한 무등산은 이제 막 옅게 색칠을 시작했다.
담양과 화순 경계를 오간다. 폐가 옆으로 새 주택이 들어섰고, 구불구불 길들도 여유롭다. 전망 좋다 싶은 곳은 여지없이 서구식 주택이 들어서 한껏 뽐을 내고, 주변으로 새로 들어선 음식점이나 커피숍들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 그중 한곳을 택해 들어갔다.
국밥, 볶음밥, 추어탕을 찾는데 메뉴판엔 없다. 슬레이트 지붕이 없어지고 서구식 주택이 들어선 것처럼 메뉴판도 온통 서구식이다. 스파게티, 탕후루, 마라탕 등 낯선 이름들이 나와 어머니 입맛을 조롱하듯 바라본다.
시장이나 읍내에서나 먹던 식사를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외진 골짜기에서 할 줄은 몰랐다. 식사 중, 내 시선은 창밖 깊은 골짜기 건물에 박혔다. 아주 오래전 봤던 건물이다. 그때는 분명 모텔이었다. 그래, 은밀한 골짜기에 잘 어울리는 모텔, 이름도 용궁 모텔이었다. 심산유곡에 용궁을 작명한 이의 의도도 우스웠지만, 도대체 누가 이용할까 궁금해서 한참을 보았었다. 그리고 기회가 생기면 여기로 와야지 내심 헛된 꿈을 꾸었던 젊은 날 기억이 뭉게뭉게 떠올랐다.
그런데 간판이 달랐다. 모텔도 커피숍도 아니었다. 녀석도 단풍처럼, 아니 추레해진 나처럼 어느새 다른 옷을 입고 있다.
요양원, 행복 요양원이었다.
묵묵히 되돌아오면서 뒷골이 당겼다. 퇴직이 눈앞이다. 당분간 쉴까. 두 번째 직장을 구해볼까, 귀향할까. 어쩌면 그 선택지에도 없는 공원이나 거리를 배회하거나 이곳저곳을 기웃거릴지 모른다.
말바우시장, 광주공원, 지하철 광장에서 서성거리는 수많은 우리들의 형님들, 그 속에 내가 끼어있을 것 같아 화들짝 놀라곤 했다.
평생 일만 하면서 꿈꾼 자유, 자기만의 삶을 선물 받은 이들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함을 모를 리 없다. 그들도 청소년처럼 우왕좌왕 방황할 줄 몰랐을 거다. 두 번째 방황은 꿈과 패기는 물론 행복 요양원 이름처럼 행복도 없다. 요양원 문턱 앞에서의 배회는 고민 아닌 고문이다.
불과 몇 년 전, 술자리에서 요양원을 하면 쉽게 돈을 번다는 이야기를 흘려들었다. 노령화 현상을 재빨리 읽는 그들 말처럼 최근에 정말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스파게티나 새우버거처럼 낱말도 익숙해졌다. 그리고 산속에 있던 것들이 시외에서 시내로 그리고 도심으로 성큼성큼 들어왔다.
요양원, 제아무리 집 옆으로 다가왔다지만 편하지 않은 곳이다. 1940~50년대 태어나 힘겨운 시대를 살아온 이들이 마지막 쉬는 간이역이고, 승객은 다름 아닌 우리 부모들이지만 선뜻 꺼리는 곳이다. 세상에서 가장 먼 곳, 세상 끝에 있는 집이다.
저 집이 꼭 바닷속 미역밭이면 좋겠다. 세상에서 가장 멀리 있지만 가장 푸른 곳이었으면 좋겠다. 하늘에서 가장 가까워 더욱 짙푸른 집, 사방이 나무들이 온통 미역 줄기처럼 치렁치렁 늘어지고 파란 바람이 부는 곳, 상처 입은 동물들이 동굴에서 몸을 추스르고, 물고기들이 이 해초에 몸을 비비면 낫듯이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견디며, 쉽지 않게 살았을 이들이 부디 평온하길 빈다.
마음과 달리 내 몸은 그곳을 향해 지금도 질주하고 있다. 거부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스스로, 내 발로 가겠다고 주먹을 꼭 쥔다. 타고 얼마 남지 않은 촛불이 휙 스치는 바람에 꺼지듯 고통 없이 소멸했으면 한다. 온 동네 떠나갈 듯 요란하게 태어났을지라도 소멸의 길은 평온하고 조용하길 바란다.
내 옆에 동승한 어머니는 지금 새근새근 주무시고 계신다. 요양원 앞이다.
담양과 화순 경계를 오간다. 폐가 옆으로 새 주택이 들어섰고, 구불구불 길들도 여유롭다. 전망 좋다 싶은 곳은 여지없이 서구식 주택이 들어서 한껏 뽐을 내고, 주변으로 새로 들어선 음식점이나 커피숍들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 그중 한곳을 택해 들어갔다.
시장이나 읍내에서나 먹던 식사를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외진 골짜기에서 할 줄은 몰랐다. 식사 중, 내 시선은 창밖 깊은 골짜기 건물에 박혔다. 아주 오래전 봤던 건물이다. 그때는 분명 모텔이었다. 그래, 은밀한 골짜기에 잘 어울리는 모텔, 이름도 용궁 모텔이었다. 심산유곡에 용궁을 작명한 이의 의도도 우스웠지만, 도대체 누가 이용할까 궁금해서 한참을 보았었다. 그리고 기회가 생기면 여기로 와야지 내심 헛된 꿈을 꾸었던 젊은 날 기억이 뭉게뭉게 떠올랐다.
요양원, 행복 요양원이었다.
묵묵히 되돌아오면서 뒷골이 당겼다. 퇴직이 눈앞이다. 당분간 쉴까. 두 번째 직장을 구해볼까, 귀향할까. 어쩌면 그 선택지에도 없는 공원이나 거리를 배회하거나 이곳저곳을 기웃거릴지 모른다.
말바우시장, 광주공원, 지하철 광장에서 서성거리는 수많은 우리들의 형님들, 그 속에 내가 끼어있을 것 같아 화들짝 놀라곤 했다.
평생 일만 하면서 꿈꾼 자유, 자기만의 삶을 선물 받은 이들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함을 모를 리 없다. 그들도 청소년처럼 우왕좌왕 방황할 줄 몰랐을 거다. 두 번째 방황은 꿈과 패기는 물론 행복 요양원 이름처럼 행복도 없다. 요양원 문턱 앞에서의 배회는 고민 아닌 고문이다.
불과 몇 년 전, 술자리에서 요양원을 하면 쉽게 돈을 번다는 이야기를 흘려들었다. 노령화 현상을 재빨리 읽는 그들 말처럼 최근에 정말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스파게티나 새우버거처럼 낱말도 익숙해졌다. 그리고 산속에 있던 것들이 시외에서 시내로 그리고 도심으로 성큼성큼 들어왔다.
요양원, 제아무리 집 옆으로 다가왔다지만 편하지 않은 곳이다. 1940~50년대 태어나 힘겨운 시대를 살아온 이들이 마지막 쉬는 간이역이고, 승객은 다름 아닌 우리 부모들이지만 선뜻 꺼리는 곳이다. 세상에서 가장 먼 곳, 세상 끝에 있는 집이다.
저 집이 꼭 바닷속 미역밭이면 좋겠다. 세상에서 가장 멀리 있지만 가장 푸른 곳이었으면 좋겠다. 하늘에서 가장 가까워 더욱 짙푸른 집, 사방이 나무들이 온통 미역 줄기처럼 치렁치렁 늘어지고 파란 바람이 부는 곳, 상처 입은 동물들이 동굴에서 몸을 추스르고, 물고기들이 이 해초에 몸을 비비면 낫듯이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견디며, 쉽지 않게 살았을 이들이 부디 평온하길 빈다.
마음과 달리 내 몸은 그곳을 향해 지금도 질주하고 있다. 거부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스스로, 내 발로 가겠다고 주먹을 꼭 쥔다. 타고 얼마 남지 않은 촛불이 휙 스치는 바람에 꺼지듯 고통 없이 소멸했으면 한다. 온 동네 떠나갈 듯 요란하게 태어났을지라도 소멸의 길은 평온하고 조용하길 바란다.
내 옆에 동승한 어머니는 지금 새근새근 주무시고 계신다. 요양원 앞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