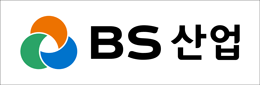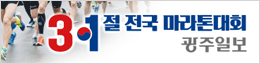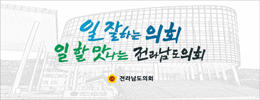[수필의 향기] ‘사이’의 일 - 김향남 수필가
 |
오래전 서점에 책을 사러 갔었다. 책값을 계산하고 나오려는데 주인이 불쑥 책 한 권을 더 주었다. 단골이라고 선심을 쓴 것이었는데, 돌아와 읽어 보니 누군가의 ‘틈’을 엿보는 것처럼 은근한 재미가 있었다. 별일 아닌 듯 시시하기도 하고, 진짜 별일인 듯 세찬 호기심이 느껴지기도 했다. 화장기 없는 민낯을 보는 것도 같고, 좀체 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고백을 듣는 것 같기도 했다. 모 작가의 산문집이었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가 아주 친밀한 사이처럼 느껴지던 것은 지금도 생생하다.
나는 늘 ‘사이’의 일들이 궁금했다. 승리한 정치가의 연설도 좋지만, 선거 전날 그의 아내와 나누었을 이야기라든가 그의 공적인 행보보다 사적인 시간이 더 알고 싶었다. 유명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영광스러운 얼굴보다 혼자 있을 때의 표정이 더 궁금했다. 먼 산의 능선처럼 실루엣만이 아니라, 나무도 보이고 풀도 보이고 낱낱의 잎맥들까지 환히 볼 수 있도록 그 사이사이를 걸어보고 싶었다.
시를 읽을 때 시도 좋지만 그 시가 지어진 배경이 궁금했고, 소설을 읽을 때 역시 누군가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더욱 솔깃해지곤 했다. 서문이나 발문, 해설 등을 빼놓지 않고 보게 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보이지 않는 것들, 말해질 수 없는 것들의 후미진 틈새.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은, 보이는 것도 같고 보이지 않는 것도 같은 그 ‘사이’의 일들이 구부러진 골목처럼 나를 손짓했다. 잔치 끝의 뒤풀이거나 무대 밖에서 만난 배우의 얼굴처럼, 진짜 이야기는 오히려 거기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린 날, 마을에 간혹 싸움이 벌어지곤 했다. 웬일인가 달려나가 보면 고함에 삿대질에 멱살까지 잡혀 있기 일쑤였다. 그걸 구경하는 재미가 여간 아니었다. 당사자들이야 열 받아 미칠 일이었지만 구경꾼은 어디 그런가. 물론 말리는 사람이 없지 않았지만 그럴수록 싸움은 더 격렬해졌다. 나는 자리를 뜨지 못했다. 무엇 때문에 벌어진 일인지 혹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앞뒤를 재보느라 머릿속이 분주했다. 내뱉는 소리만 가지고는 자초지종을 알기 어려웠다. 말은 앞뒤가 잘린 채 파편처럼 튀거나 주먹이 되어 날았으므로, 그 ‘사이’를 채워 넣는 일은 관객의 몫이었다. 말해지지 않은 그것이야말로 싸움의 진짜 이유일 터, 그걸 추정해 보는 것이 관전의 포인트였다.
이런 일도 있었다. 열여섯 가을이었다. 한 친구로부터 두툼하게 부푼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뜬금없는 일은 아니었다. 웬일인지 그즈음 나도 모르게 문득문득 그 친구 얼굴이 떠오르곤 했으니까. 때마침 받은 편지가 신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것은 기적’이라는 말, 그 말이 딱 들어맞은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지, 어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보고도 못 본 척 그냥 지나가던 사이였지 않은가. 하지만 그보다 더 의아스러웠던 것은 숫기라곤 없어 보이던 녀석이 그렇게나 간지러운 수다쟁이라는 사실이었다. 줄줄이 써 내려간 말들이 한순간에 이해되고 말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 암만 생각해도 신통한 것이었다. 지구와 달이 보이지 않는 중력으로 서로 묶여 있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끌림이라는 게 있는 건가. 서로 이끌리는 그 ‘사이’의 힘으로 너와 내가, 우리가 있는 것인가.
돌아보면 다 ‘사이’의 일이지 싶다. 너와 나, 사람과 사람을 받치고 있는 것도 ‘사이’의 여백이 아닐까.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들도 ‘사이’를 들여다보면 어렴풋이나마 맥이 잡힌다. 그것은 드러나 있기보다 감춰져 있으며, 채워져 있기보다 비어 있을 때가 많다.
가령 성공보다는 실패, 좌절, 혼돈, 외로움 같은 것. 기쁨보다 슬픔. 추억보다 상처. 그때는 몰랐으나 지금은 알게 된 것들. 그런 연후면 내 삶도 조금은 가지런해지는 기분이 든다. 사실 그런 시간을 거치지 않는다면 삶은 그저 무의미한 사건의 연속일 뿐이거나 흩어진 파편에 불과할지 모른다. 서 말 구슬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 우리의 삶도 유의미한 해석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리라. 진실의 여백을 따라 사잇길 하나 마련해두고 가끔은 그 길을 걸어볼 일이다. 조붓하게 열린 길을 따라 생의 비의(秘義)를 풀어내듯….
어린 날, 마을에 간혹 싸움이 벌어지곤 했다. 웬일인가 달려나가 보면 고함에 삿대질에 멱살까지 잡혀 있기 일쑤였다. 그걸 구경하는 재미가 여간 아니었다. 당사자들이야 열 받아 미칠 일이었지만 구경꾼은 어디 그런가. 물론 말리는 사람이 없지 않았지만 그럴수록 싸움은 더 격렬해졌다. 나는 자리를 뜨지 못했다. 무엇 때문에 벌어진 일인지 혹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앞뒤를 재보느라 머릿속이 분주했다. 내뱉는 소리만 가지고는 자초지종을 알기 어려웠다. 말은 앞뒤가 잘린 채 파편처럼 튀거나 주먹이 되어 날았으므로, 그 ‘사이’를 채워 넣는 일은 관객의 몫이었다. 말해지지 않은 그것이야말로 싸움의 진짜 이유일 터, 그걸 추정해 보는 것이 관전의 포인트였다.
이런 일도 있었다. 열여섯 가을이었다. 한 친구로부터 두툼하게 부푼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뜬금없는 일은 아니었다. 웬일인지 그즈음 나도 모르게 문득문득 그 친구 얼굴이 떠오르곤 했으니까. 때마침 받은 편지가 신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것은 기적’이라는 말, 그 말이 딱 들어맞은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지, 어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보고도 못 본 척 그냥 지나가던 사이였지 않은가. 하지만 그보다 더 의아스러웠던 것은 숫기라곤 없어 보이던 녀석이 그렇게나 간지러운 수다쟁이라는 사실이었다. 줄줄이 써 내려간 말들이 한순간에 이해되고 말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 암만 생각해도 신통한 것이었다. 지구와 달이 보이지 않는 중력으로 서로 묶여 있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끌림이라는 게 있는 건가. 서로 이끌리는 그 ‘사이’의 힘으로 너와 내가, 우리가 있는 것인가.
돌아보면 다 ‘사이’의 일이지 싶다. 너와 나, 사람과 사람을 받치고 있는 것도 ‘사이’의 여백이 아닐까.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들도 ‘사이’를 들여다보면 어렴풋이나마 맥이 잡힌다. 그것은 드러나 있기보다 감춰져 있으며, 채워져 있기보다 비어 있을 때가 많다.
가령 성공보다는 실패, 좌절, 혼돈, 외로움 같은 것. 기쁨보다 슬픔. 추억보다 상처. 그때는 몰랐으나 지금은 알게 된 것들. 그런 연후면 내 삶도 조금은 가지런해지는 기분이 든다. 사실 그런 시간을 거치지 않는다면 삶은 그저 무의미한 사건의 연속일 뿐이거나 흩어진 파편에 불과할지 모른다. 서 말 구슬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 우리의 삶도 유의미한 해석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리라. 진실의 여백을 따라 사잇길 하나 마련해두고 가끔은 그 길을 걸어볼 일이다. 조붓하게 열린 길을 따라 생의 비의(秘義)를 풀어내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