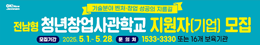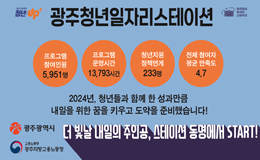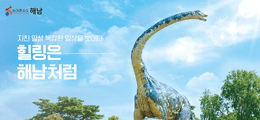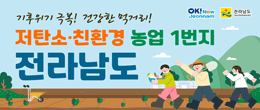[박찬일의 ‘밥 먹고 합시다’ ]고등어도 맘 놓고 못 먹습니다
 |
요리사는 재료에서 시작한다. 좋은 재료가 있어야 요리를 잘 만들 수 있다. 요리도 자본 세계에 들어가 있어서 재료의 값도 계층화되었다. 이를 테면 ‘싼 성게알’이나 ‘싼 투플러스 한우등심’은 없다. 돈이 정해 주는 계급에 따라 접근이 되는 재료가 나뉘어 버린 세상이다. 서양 얘기를 하서 안됐지만 흥미로운 예를 들어 보자. 서양은 와인을 즐겨 마신다. 30년 전에는 제일 비싼 와인들과 중간 가격대 와인들의 가격 비가 대략 열 배 이상 넘어가지 않았다. 주머니가 가벼운 사람이라도 딸의 결혼식에 비싼 와인을 몇 병 정도 딸 수 있었다. 이제는 그 격차가 너무 커졌다. 30년 전에 병당 10만 원대이던 프랑스 메독 지방의 특급 와인들은 이제 열 배 이상 줘야 살 수 있다. 서양 사람들이 특별한 날에 따고 싶은 가장 인기 있는 와인이 그렇게 됐다. 와인은 우리가 뭐 꼭 마셔야 하는 건 아니니 그 까짓것, 포기하면 그만이다. 문제는 대중적으로 쉽게 먹을 수 있던 음식들도 재료비가 치솟아 접근이 어려워진다.
나는 이십여 년 전부터 수산물 시장을 보고 있는데, 이제는 해물의 미래가 바닥을 보인다는 느낌을 받는다. 물량도 줄고, 값도 너무 비싸다. 기름값, 인건비는 치솟고 고기는 잘 안 잡힌다. 굳이 힘들게 바다로 나가서 얼마라도 잡아오는 건 선장님들이 배 융자를 갚아야 하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그들이 배를 팔고 나면 이제 누가 고기 잡으러 가나. 내 거래처인 생선 도매상 한 분은 밤 12시쯤 페이스북에 글과 사진을 올린다. 그 시간이면 서울의 경우 생선 도매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일 때이다. 헌데 이 분의 글은 벌써 1년째 똑같다. 계절별로 어종은 바뀌지만 요즘 철 기준으로 소개하면 이렇다. “오늘 경매장에 생선이 별로 없습니다. 고등어 극소량, 청어 극소량, 오징어 약간, 구이용 삼치 약간….” 내가 지어준 별명이 ‘극소량’이다.
처음에는 그래도 며칠 지나면 가끔이라도 “오늘은 생선이 대풍입니다”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생선이 없기 때문이다. 생선을 직거래하는 한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산지의 어민과 소비자를 직결해 주는 사업이다. 거기 가입해서 소소한 해물을 조달하는데 어쩌다 이런 광고들이 뜬다. “제주 씨오션호 한치 대풍!” 얼씨구나 하고 클릭을 해보면 한 30킬로그램 잡았다고 써 있다. 요새는 세 상자, 네 상자를 잡아도 대풍이라고 한다. 만선이라고는 차마 양심상 할 수 없고 그래도 소비자 주의를 끌려고 대풍이라지만 실제 어획은 초라하다. 몇 푼 송금하고 생선을 받으면서도 어민에게 돈 주고 사먹는 내가 오히려 다 미안하다. 그들도 비슷할 거다. “아휴, 미치겠어요. 고기 안 잡히는 게 돈도 돈이지만 이거 할 일이 못 된다 싶어요.” 이런 말을 많이도 들었다.
고기가 없다. 바다는 매일 힘든 소식뿐이다. 폐그물이 돈다. 뭔 바이러스로 양식도 안 팔린다,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 중국 어선이 싹쓸이한다, 기름값 뛰어서 어로 포기한다. 선원 못 구해서 출어 안 된다. 일하던 선원들이 다른 데로 사라졌다, 노령 인구 급증으로 뒷일 봐주던 일손(여성 어민들)을 못 구한다…. 기막힌 일이다.
예전에 잘 가던 서울 강남의 한 생선구이집이 있었다. 철마다 가장 싼 생선을 열 박스고 스무 박스고 사서 작업장에 부려 놓고 배 따서 구워 팔았다. 생선구이 무한 리필집으로 유명했다. 가자미나 꽁치, 고등어, 삼치철에는 그 식당 작업장을 보면 생선이 너무 많아서 바닥에 막 부려 놓고 장화 신고 빠져 가면서 일하는 게 보였다. 거짓말 좀 보태서 작업자들 허리까지 생선이 찼다. 이제 그 집은 아귀찜집이 됐다. 리필은 당연히 없다. 옛 추억에 가서 앉아서 보는데 아귀 원산지가 미국이랑 중국이다. 국산 안 써요? 하고 물었더니 비싸고 큰 놈이 없어서 수입 쓴다고 넋두리다. ‘한때 사장님 장화 신고 하루 종일 생선 배 따셨는데’하고 말하려다 참았다. 부아 돋워서 욕을 먹을 것 같았다.
못 잡으면 양식해서 길러 먹는다고 하는데,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친다. 생선 양식 개발은 고도의 전문성으로 연구해서 극히 일부만 사업성이 생긴다.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다. 게다가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는데, 양식 어종도 먹이로 바닷고기를 줘야 한다. 살만큼 산 우리야 그만 먹어도 할 수 없지, 이러고 살 수도 있겠지만 후손들이 우리 바다 맛있는 고기도 제대로 못 먹는다면 그것도 쉽지 않다. 향토음식 한다는 제주도 식당에서 며칠 전 점심으로 노르웨이 고등어구이를 먹었다. <음식칼럼니스트>
고기가 없다. 바다는 매일 힘든 소식뿐이다. 폐그물이 돈다. 뭔 바이러스로 양식도 안 팔린다,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 중국 어선이 싹쓸이한다, 기름값 뛰어서 어로 포기한다. 선원 못 구해서 출어 안 된다. 일하던 선원들이 다른 데로 사라졌다, 노령 인구 급증으로 뒷일 봐주던 일손(여성 어민들)을 못 구한다…. 기막힌 일이다.
예전에 잘 가던 서울 강남의 한 생선구이집이 있었다. 철마다 가장 싼 생선을 열 박스고 스무 박스고 사서 작업장에 부려 놓고 배 따서 구워 팔았다. 생선구이 무한 리필집으로 유명했다. 가자미나 꽁치, 고등어, 삼치철에는 그 식당 작업장을 보면 생선이 너무 많아서 바닥에 막 부려 놓고 장화 신고 빠져 가면서 일하는 게 보였다. 거짓말 좀 보태서 작업자들 허리까지 생선이 찼다. 이제 그 집은 아귀찜집이 됐다. 리필은 당연히 없다. 옛 추억에 가서 앉아서 보는데 아귀 원산지가 미국이랑 중국이다. 국산 안 써요? 하고 물었더니 비싸고 큰 놈이 없어서 수입 쓴다고 넋두리다. ‘한때 사장님 장화 신고 하루 종일 생선 배 따셨는데’하고 말하려다 참았다. 부아 돋워서 욕을 먹을 것 같았다.
못 잡으면 양식해서 길러 먹는다고 하는데,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친다. 생선 양식 개발은 고도의 전문성으로 연구해서 극히 일부만 사업성이 생긴다.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다. 게다가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는데, 양식 어종도 먹이로 바닷고기를 줘야 한다. 살만큼 산 우리야 그만 먹어도 할 수 없지, 이러고 살 수도 있겠지만 후손들이 우리 바다 맛있는 고기도 제대로 못 먹는다면 그것도 쉽지 않다. 향토음식 한다는 제주도 식당에서 며칠 전 점심으로 노르웨이 고등어구이를 먹었다. <음식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