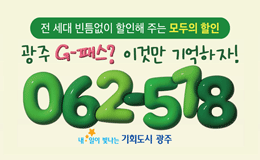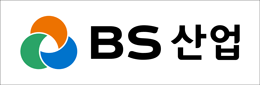기억의 캔버스- 김향남 수필가
 |
지나간 일 혹은 남아 있는 기억들은 언제나 채색을 기다리는 미완의 캔버스 같다. 나는 가끔 그것들을 불러와 조심조심 색칠을 해 본다. 일부러 불러온다기보다 불현듯 다가오는 경우가 더 많지만, 어떤 기억은 왔다가 슬그머니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어떤 기억은 줄기차게 파고들어 시간조차 잊게 한다. 때로는 미로처럼 헤매게 하기도 하고 숨은 그림처럼 지레 몸을 감추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그로 하여 한 시절이 환하게 빛나기도 하고, 혹은 먹먹하도록 슬퍼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 나는 다시 사는 것 같다. 봄을 기다리는 겨울나무처럼 자못 비장해지기도 한다. 미완의 캔버스 하나를 색칠하고 나면 슬픔도 슬픔만이 아니고 고통도 고통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빈 산에 진달래 화르르 피어오른 봄날, 꽃놀이 간 엄마가 취해서 돌아온 날.
그날, 종일 집을 비운 엄마는 산뜻했던 아침과는 달리 전혀 딴사람이 되었다. 머리도 치마저고리도 뭉개진 꽃숭어리처럼 후줄근해 돌아왔다. 하지만 아직 남은 흥이 더 있었는지 흥얼흥얼 노래를 그치지 않았다. 웃는 듯 우는 듯 표정조차 야릇했지만 멈출 기미는 없어 보였다.
노오들 가앙변에 봄버어어들 휘휘 늘어진 가아지에다가 무저엉 세에워얼….
엄마가 왜 저럴까. 엄마를 말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뜬금없는 사태에 건넌방의 아버지도 벌컥 문을 열고 나오셨다. 웬 소란인가 한눈에 파악되는 일이었지만 당황스러운 건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인 듯했다.
그 사이 엄마는 비틀비틀 쓰러지듯 마루에 누워 버렸다. 순식간에 노랫소리도 잦아들고 어느새 잠이 들었나 싶었다. 그러나 엄마는 다시 또 딴사람이 되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온몸을 뒤틀었다. 아으으윽, 숨쉬기도 힘겨운 듯 괴로운 신음을 토해냈다. 엄마 왜 그래? 엄마가 무서웠다. 혹시나 죽는 건 아닌지 엄마를 잡고 흔들었다. 급기야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엄마도 엄마지만 아버지도 무서웠다. 왜 우느냐 버럭 고함이라도 지를 것만 같았다. 아버지는 다정하고는 거리가 먼 분이었다. 과묵하고 급했으며 고지식하기까지 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늦잠 한번 잘 수도 없었다. 무슨 일이 있건 없건 동 트면 일어나야 하는 것이 당신의 철칙이었다. 엄마는 엄하게 조일 줄만 알았지 융통성이라곤 없다고 아버지를 비난했다. 어떤 상황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 아버지의 고지식은 늘 싸움의 빌미가 되곤 했다. 두 분의 싸움은 팔 할이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여튼 불 같은 성미를 지니신 우리 아버지가 그대로 계실 것 같진 않았다. 나도 나지만 엄마에게 떨어질 불똥도 만만찮게 커 보였다. 화전놀이 한다고 온종일 집을 비운 것도 모자라 이건 또 무슨 주정이란 말인가, 대뜸 큰소리부터 칠 것 같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심하게 일그러져 있을 뿐 안절부절못하시는 게 역력했다. 아버지는 몸부림치는 엄마를 안방으로 눕히며 황급히 언니를 불렀다.
어서 약방에 좀 다녀오너라.
언니는 훈련된 병사처럼 곧장 약방으로 내달렸다. 십여 리나 되는 길을 어떻게 그리 빨리도 다녀왔는지…. 이윽고 매캐한 연기 속에 탕약이 끓었다. 엄마는 간신히 잠이 들고 아버지는 담배를 찾아 무셨다. 길고 긴 봄날 저녁이 아버지의 손끝에서 연기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기억을 더듬어 다시 슬픔에 잠긴다. 모처럼의 소풍날, 엄마는 향그러운 꽃지짐에 먹고 마시고 흔들고 부르며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왔지만, 가슴속의 응어리는 끝내 풀지 못하였던가. 그 불덩이는 어떤 것으로도 끌 수가 없었던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었던, 자식 걱정만 주렁주렁 안고 살던 당신의 생애가 못내 애달프다.
그날 그 노래와 그 가슴앓이와 그 담배 연기 속에서 한 바가지 슬픔을 길어 올린다. 그 물로 얼굴을 적시고, 그 물로 다시 정갈해지곤 하면서 새로이 또 한 슬픔을 맞는다. 쓰리고 아픈 기억도 시간이 흐르니 그리움이 된다.
그날, 종일 집을 비운 엄마는 산뜻했던 아침과는 달리 전혀 딴사람이 되었다. 머리도 치마저고리도 뭉개진 꽃숭어리처럼 후줄근해 돌아왔다. 하지만 아직 남은 흥이 더 있었는지 흥얼흥얼 노래를 그치지 않았다. 웃는 듯 우는 듯 표정조차 야릇했지만 멈출 기미는 없어 보였다.
엄마가 왜 저럴까. 엄마를 말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뜬금없는 사태에 건넌방의 아버지도 벌컥 문을 열고 나오셨다. 웬 소란인가 한눈에 파악되는 일이었지만 당황스러운 건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인 듯했다.
그 사이 엄마는 비틀비틀 쓰러지듯 마루에 누워 버렸다. 순식간에 노랫소리도 잦아들고 어느새 잠이 들었나 싶었다. 그러나 엄마는 다시 또 딴사람이 되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온몸을 뒤틀었다. 아으으윽, 숨쉬기도 힘겨운 듯 괴로운 신음을 토해냈다. 엄마 왜 그래? 엄마가 무서웠다. 혹시나 죽는 건 아닌지 엄마를 잡고 흔들었다. 급기야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엄마도 엄마지만 아버지도 무서웠다. 왜 우느냐 버럭 고함이라도 지를 것만 같았다. 아버지는 다정하고는 거리가 먼 분이었다. 과묵하고 급했으며 고지식하기까지 했다.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늦잠 한번 잘 수도 없었다. 무슨 일이 있건 없건 동 트면 일어나야 하는 것이 당신의 철칙이었다. 엄마는 엄하게 조일 줄만 알았지 융통성이라곤 없다고 아버지를 비난했다. 어떤 상황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 아버지의 고지식은 늘 싸움의 빌미가 되곤 했다. 두 분의 싸움은 팔 할이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여튼 불 같은 성미를 지니신 우리 아버지가 그대로 계실 것 같진 않았다. 나도 나지만 엄마에게 떨어질 불똥도 만만찮게 커 보였다. 화전놀이 한다고 온종일 집을 비운 것도 모자라 이건 또 무슨 주정이란 말인가, 대뜸 큰소리부터 칠 것 같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심하게 일그러져 있을 뿐 안절부절못하시는 게 역력했다. 아버지는 몸부림치는 엄마를 안방으로 눕히며 황급히 언니를 불렀다.
어서 약방에 좀 다녀오너라.
언니는 훈련된 병사처럼 곧장 약방으로 내달렸다. 십여 리나 되는 길을 어떻게 그리 빨리도 다녀왔는지…. 이윽고 매캐한 연기 속에 탕약이 끓었다. 엄마는 간신히 잠이 들고 아버지는 담배를 찾아 무셨다. 길고 긴 봄날 저녁이 아버지의 손끝에서 연기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기억을 더듬어 다시 슬픔에 잠긴다. 모처럼의 소풍날, 엄마는 향그러운 꽃지짐에 먹고 마시고 흔들고 부르며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왔지만, 가슴속의 응어리는 끝내 풀지 못하였던가. 그 불덩이는 어떤 것으로도 끌 수가 없었던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었던, 자식 걱정만 주렁주렁 안고 살던 당신의 생애가 못내 애달프다.
그날 그 노래와 그 가슴앓이와 그 담배 연기 속에서 한 바가지 슬픔을 길어 올린다. 그 물로 얼굴을 적시고, 그 물로 다시 정갈해지곤 하면서 새로이 또 한 슬픔을 맞는다. 쓰리고 아픈 기억도 시간이 흐르니 그리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