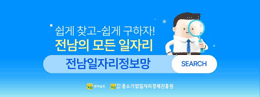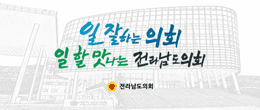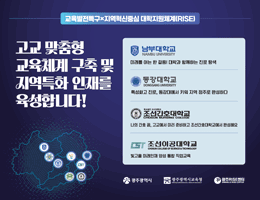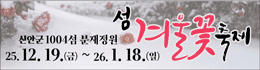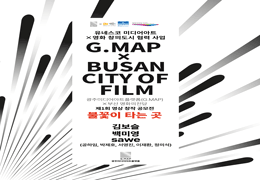<247> 주희, 성리학 집대성…‘주자’로 존중의 대상
 <초당대총장> |
주희(朱熹, 1130~1200)의 자는 원회, 호는 회옹으로 복건성 우계 출신이다. 북송의 주돈이, 정호, 정이의 사상을 이어받아 성리학을 집대성 했다는 평을 받는다. 유학계에서는 주자(朱子)로 존숭의 대상이 되었다.
집안은 대대로 안휘성의 호족으로 부친 주위재는 남송에 출사하였으나 재상 진회와의 이견으로 은퇴해 고향 우계에 은거하였다. 1148년 19세때 진사에 급제했다. 고종, 효종, 광종 3대에 걸쳐 지방관으로 근무했다. 1194년 영종이 즉위하고 조여우가 재상이 되자 황제의 고문격인 시강(侍講)에 기용되었다. 그러나 권신 한덕주의 권모술수로 조여우가 퇴직하고 주희 등 일련의 학자들이 조정에서 퇴출되었다. 그의 학문은 위학(僞學)으로 간주되고 제자들도 관직에 나갈 수 없었다. 유명한 경원위학지금(慶元僞學之禁)이다. 후일 명대의 철학가 이탁오는 주희가 탄압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영종 사후 이종이 즉위하자 명예가 회복되어 태사휘국공(太師徽國公)에 추증되었다.
주희는 부친 사후 호적계, 유벽수, 유병산에서 사사하였다. 불교와 도교에도 흥미를 가졌으나 이연평을 만나 유학 연구에 전념하게 되었다. 그는 명분과 절의를 중시하였다. 금나라와의 화약을 강력히 반대했다. 오랑캐와의 타협은 우주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금나라를 많은 백성을 죽인 금수만도 못한 불구대천의 원수로 규정했다. 후일 주자학을 신봉하는 관리나 학자가 유독 명분론에 집착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선 후기 송시열과 노론 강경파도 이러한 사상적 흐름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희는 북송의 주돈이, 정호, 정이가 추구한 도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사상적으로 정리해 주자학의 시조로 불린다. 유학의 최고 가치인 도(道)의 정통을 스스로 이어받았다고 생각했다. 송사 ‘도학전’에는 “맹자 이후는 주자, 정자, 장자가 단절된 도를 계승했고 주희에 이르러 비로서 명확해져 식자들은 정론(正論)이라고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기이원론(理氣二元論)의 입장에서 만물은 기로 구성되지만 이를 움직이는 원리는 이로 보았다. 사람은 이를 바탕으로 성(性)을 이룬다. 무릇 형태가 있고 모습이 있는 것이 기(器)이고 그 원리가 되는 것이 이 즉 도이다. 형이상자(形而上者)는 형체도 없고 그림자도 없는 것, 즉 이이고 형이하자(形而下者)는 실상도 없고 모습도 없는 것 즉 기이다. 온갖 이가 있기 때문에 온갖 사물이 있는 것이다.
육상산은 주희와 논쟁한 인물이었는데 주자학이 너무 사변적이고 공리공론에 빠져들었다고 비판하고 유심론(唯心論)을 강조했다. 우주의 본체인 이는 곧 심(心)이라는 입장으로, 육상산의 심즉리(心卽理)와 주희의 성즉리(性卽理)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그가 이끄는 상산학파는 우주 각 방면의 해석이 지나치게 소략해 주자학에 미칠 수 없었다. 그래서 송대 말엽 이후에는 주자학이 유학의 정통을 차지하게 되었다. 송사 도학전은 주자를 중심으로 서술했고 상산은 유림전에 포함했다.
주희는 여러 책에 다양한 주석과 편집을 했었는데 특히 사서집주(四書集注) 편찬에 심혈을 기울였다. 사서는 대학, 중용, 논어, 맹자를 포함한다. 그의 노력으로 사서는 오경과 함께 유학의 경전으로 존중받게 되었다. 특히 대학과 중용의 학습을 강조하였다.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을 저술해 오대(五代)까지의 중국 역사를 편년체로 서술해 역사적 사실에 대해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했다. 특히 화이(華夷)의 구분을 철저히 하였다. 그의 명분론적 사관은 조선과 도꾸가와 막부의 일본 역사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단호한 처신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평생 한결같았다. 심한 추위나 더위를 만나도 한순간 흐트러짐이 없었다. 부모에게 효심을 다했고 아랫사람에게는 자애로웠다. 내외간에 매우 정숙하였다. 제사를 지낼 때에는 모든 일에 정성과 경건함을 다했다.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 의복은 몸을 가리고 음식은 배를 채울 정도면 만족하였다. 집은 비바람을 막을 정도였다. 평생 이렇게 생활하며 아주 풍족히 여겼다.
집안은 대대로 안휘성의 호족으로 부친 주위재는 남송에 출사하였으나 재상 진회와의 이견으로 은퇴해 고향 우계에 은거하였다. 1148년 19세때 진사에 급제했다. 고종, 효종, 광종 3대에 걸쳐 지방관으로 근무했다. 1194년 영종이 즉위하고 조여우가 재상이 되자 황제의 고문격인 시강(侍講)에 기용되었다. 그러나 권신 한덕주의 권모술수로 조여우가 퇴직하고 주희 등 일련의 학자들이 조정에서 퇴출되었다. 그의 학문은 위학(僞學)으로 간주되고 제자들도 관직에 나갈 수 없었다. 유명한 경원위학지금(慶元僞學之禁)이다. 후일 명대의 철학가 이탁오는 주희가 탄압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영종 사후 이종이 즉위하자 명예가 회복되어 태사휘국공(太師徽國公)에 추증되었다.
육상산은 주희와 논쟁한 인물이었는데 주자학이 너무 사변적이고 공리공론에 빠져들었다고 비판하고 유심론(唯心論)을 강조했다. 우주의 본체인 이는 곧 심(心)이라는 입장으로, 육상산의 심즉리(心卽理)와 주희의 성즉리(性卽理)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그가 이끄는 상산학파는 우주 각 방면의 해석이 지나치게 소략해 주자학에 미칠 수 없었다. 그래서 송대 말엽 이후에는 주자학이 유학의 정통을 차지하게 되었다. 송사 도학전은 주자를 중심으로 서술했고 상산은 유림전에 포함했다.
주희는 여러 책에 다양한 주석과 편집을 했었는데 특히 사서집주(四書集注) 편찬에 심혈을 기울였다. 사서는 대학, 중용, 논어, 맹자를 포함한다. 그의 노력으로 사서는 오경과 함께 유학의 경전으로 존중받게 되었다. 특히 대학과 중용의 학습을 강조하였다.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을 저술해 오대(五代)까지의 중국 역사를 편년체로 서술해 역사적 사실에 대해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했다. 특히 화이(華夷)의 구분을 철저히 하였다. 그의 명분론적 사관은 조선과 도꾸가와 막부의 일본 역사학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단호한 처신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평생 한결같았다. 심한 추위나 더위를 만나도 한순간 흐트러짐이 없었다. 부모에게 효심을 다했고 아랫사람에게는 자애로웠다. 내외간에 매우 정숙하였다. 제사를 지낼 때에는 모든 일에 정성과 경건함을 다했다.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 의복은 몸을 가리고 음식은 배를 채울 정도면 만족하였다. 집은 비바람을 막을 정도였다. 평생 이렇게 생활하며 아주 풍족히 여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