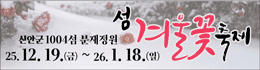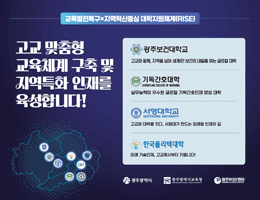경계인으로 살아가기
 |
매년 수많은 건축물들이 지어지고, 소멸되고 있다. 건축물도 생로병사한다. 운명의 주도권은 소유자(건축주)의 몫이지만 건축물의 처음과 마지막 모든 과정에 건축사(建築士)가 함께 한다. 건축사는 건축주, 시행사, 시공자, 구매자, 이용자 등등 이해관계자들의 욕망이 상충되는 경계를 넘나들며 업무를 한다.
경계인(境界人)이란 말이 많이 회자된 적이 있었다. 경계인이란 오랫동안 소속됐던 집단을 떠나 다른 집단으로 옮겼을 때, 원래 집단의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금방 버릴 수 없고, 새로운 집단에도 충분히 적응되지 않아서 어정쩡한 상태에 놓인 사람을 말한다. 재독 사회학자인 송두율 교수는 자신의 저서 ‘경계인의 사색’에서 자신을 ‘경계의 이쪽에도, 저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경계선 위에 서서 상생의 길을 찾아 여전히 헤매고 있는 존재, 경계인’으로 규정했다. 필자는 경계인을 이쪽 경계 안에 있다가 저쪽 경계 안으로 갔다 왔다 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그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상생의 길을 찾아 헤매는 존재로 생각해 본다.
필자는 ‘건축사’란 면허를 가지고 경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건축사는 인간 삶의 공간에 필요한 기본 3요소인 ‘안전’, ‘기능’, ‘미’ 추구를 바탕으로 업무를 한다. 이를 충실히 수행하라고 국가가 권한(?)을 부여한 전문가다. 그 경계인의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한가?
첫째, 건축 설계자로서 경계인이다. 설계는 주문 생산이다. 주문자인 건축주가 고객이다. 설계자를 선택하는 것은 고객의 권한이다. 고객은 개인, 시행사, 공공기관, 단체 등 다양하다. 그들의 입맛에 맞아야 한다. 설계안은 정답이 없다. 여러 전제들을 잘 조사하고, 그간의 축적된 역량으로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마음과 조건과 상황들의 경계 안에서 선택하고, 공간을 조직해야 한다. 만약, 개인이나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고객에게 건축의 사회적 가치나 공공성을 강하게 주장했다가는 수주에 문제가 생긴다. 경계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지속가능하다.
둘째, 조정자로서 경계인이다. 필자는 두 곳의 공공 프로젝트에 기획과 설계 조정, 공사 현장 감독 보조(?) 등의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다른 건축사의 도면을 조정하기란 쉽지 않다. 기획부터 참여한 프로젝트는 그나마 대화가 가능하지만, 이미 설계를 마감한 다음에 개념을 변경한다는 것은 힘들다. 장소와 공간에 대한 개념의 재해석, 기능의 변화를 조정해야 하는 입장에서 설계자, 감리자, 시공사, 감독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경계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 이런 경계들의 교집합이 잘 모여야 완성품이 만들어 진다. 좋은 완성품을 위해서는 각자의 지식과 지혜, 유연한 생각과 창의성, 열정과 자부심을 발산하고 융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계인 조정자의 중요한 역할이다.
셋째, 심의위원으로서 경계인이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건축 허가를 득하기 위해 각종 심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필자도 심의를 받기도 하고, 심의를 하기도 한다. 관점이 다르니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다. 설계자는 건축주의 경계선 안에 더 들어가 있을 것이고, 심의위원은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도시 경관과 거주자 편의, 이용자와 주변에서 바라봐야 하는 시민 등의 경계선 안에 있어야 한다. 눈앞에 있는 0.0001% 건축주와 99.9999%의 시민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려면 높은 시선의 사유가 필요한 이유다. 나는 잘 하고 있는가? 말할 수 없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각각의 상황에서 경계인이 될 수밖에 없다. 늘 ‘을’의 입장만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갑’이 되기도 한다. 경계인으로서 높은 차원의 균형 감각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다. 입장을 서로 바꾸어서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가 필요한 이유다. 이런 역량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나의 숙제다. 지금부터 숙제를 잘해야겠다.
첫째, 건축 설계자로서 경계인이다. 설계는 주문 생산이다. 주문자인 건축주가 고객이다. 설계자를 선택하는 것은 고객의 권한이다. 고객은 개인, 시행사, 공공기관, 단체 등 다양하다. 그들의 입맛에 맞아야 한다. 설계안은 정답이 없다. 여러 전제들을 잘 조사하고, 그간의 축적된 역량으로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마음과 조건과 상황들의 경계 안에서 선택하고, 공간을 조직해야 한다. 만약, 개인이나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고객에게 건축의 사회적 가치나 공공성을 강하게 주장했다가는 수주에 문제가 생긴다. 경계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지속가능하다.
둘째, 조정자로서 경계인이다. 필자는 두 곳의 공공 프로젝트에 기획과 설계 조정, 공사 현장 감독 보조(?) 등의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다른 건축사의 도면을 조정하기란 쉽지 않다. 기획부터 참여한 프로젝트는 그나마 대화가 가능하지만, 이미 설계를 마감한 다음에 개념을 변경한다는 것은 힘들다. 장소와 공간에 대한 개념의 재해석, 기능의 변화를 조정해야 하는 입장에서 설계자, 감리자, 시공사, 감독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경계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 이런 경계들의 교집합이 잘 모여야 완성품이 만들어 진다. 좋은 완성품을 위해서는 각자의 지식과 지혜, 유연한 생각과 창의성, 열정과 자부심을 발산하고 융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계인 조정자의 중요한 역할이다.
셋째, 심의위원으로서 경계인이다.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건축 허가를 득하기 위해 각종 심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필자도 심의를 받기도 하고, 심의를 하기도 한다. 관점이 다르니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다. 설계자는 건축주의 경계선 안에 더 들어가 있을 것이고, 심의위원은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도시 경관과 거주자 편의, 이용자와 주변에서 바라봐야 하는 시민 등의 경계선 안에 있어야 한다. 눈앞에 있는 0.0001% 건축주와 99.9999%의 시민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려면 높은 시선의 사유가 필요한 이유다. 나는 잘 하고 있는가? 말할 수 없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는 각각의 상황에서 경계인이 될 수밖에 없다. 늘 ‘을’의 입장만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는 ‘갑’이 되기도 한다. 경계인으로서 높은 차원의 균형 감각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다. 입장을 서로 바꾸어서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가 필요한 이유다. 이런 역량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나의 숙제다. 지금부터 숙제를 잘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