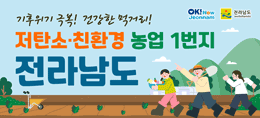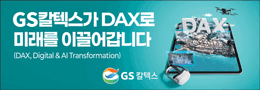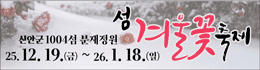지속 가능한 농촌이 되려면
 |
서류 한 장에 이곳저곳 옮겨 다녀야하는 게 직장인이라지만 근무지가 몇 번씩 바뀌다 보니 이런저런 모임이 많아진다. 한 팀에 근무했던 정을 잊지 말자고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같은 취미를 가진 동호인끼리 어울려 등산이나 운동을 즐기는 것은 직장 생활의 활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중에는 신입 회원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가는 모임도 있다. 20년째 총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 오십에 무슨 막내노릇이냐고 투덜대는 구성원이 있다면 머지않아 흐지부지 될 공산이 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농림어업 조사’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농가 인구는 242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4000명이 줄었다. 농가 수도 104만2000가구로 2만6000가구, 2.5%나 감소했다. 최근 20년간 농가 인구는 반으로, 농가 수는 30%가 줄어든 것인데, 탈농 현상의 가속화와 전업 등에 따른 것이다. 국내 전체 인구에서의 비율도 4.7%로 0.2% 줄었다.
가구 수가 감소한 반면 고령화는 더욱 진전되어, 65세 이상 농가 고령 인구 비율은 42.5%로 1년 전에 비해 40.3%에서 2.2% 늘었다. 국내 전체 고령 인구 비율(13.8%)도 늘고 있지만 농촌의 고령화율은 전체 평균보다 세 배 이상 높은 것이다.
60세 이상 농업인은 134만 명으로 전체 농가 인구의 절반 이상(55.3%) 이었다. 70세 이상은 3.2% 늘어난 반면, 60대 이하로는 모두 줄었다. 이대로라면 농가 인구가 200만 이하로 주저앉을 날이 10년이 채 걸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내친 김에 전국 가구 분포도 한번 살펴보자. 총 1984만 가구 중 수도권은 965만 가구(48.6%), 비수도권은 1019만 가구(51.4%)로 반반에 가깝다. 특별시와 광역시에 900만 가구(45.4%)가 사는 반면, 도 지역에는 1083만(51.4%)에 불과해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0~39세의 가임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인구 소멸 지수는 1.0 이하가 인구 쇠퇴의 시작을, 0.5 미만은 소멸 위험으로 분류하는데, 전남은 0.5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았으며, 22개 시군 중 78%인 17개소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니 출산율이 줄고 폐가와 폐교가 늘어나며 마트와 학원, 미장원 등 생활 편의 시설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반가운 것은 청년층의 유입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도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 추가 선발을 해야 할 만큼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전국의 40세 미만, 영농 경력 3년 이하의 청년 창업농 1200명을 선발해 월 100만 원까지 영농 정착 지원금을 3년간 지원하는 이 사업에 3326명이 지원하여 2.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여성 지원자가 577명으로 신청자의 17%가 넘고, 영농 경험이 없거나 1년차 농업인이 전체 지원자의 73,3%에 달해 도시 청년의 농촌 유입을 기대하게 한다는 것이다.
농촌에 영농 기반이 있는 부모를 가진 신청자가 67%에 달해 부모의 후광만 업고 영농 의사는 별반 없는 사람이 지원한다거나, 지원 자금 유용 등을 걱정하는 시선도 있으나,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면 청년 실업률을 낮출 성공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년들의 농촌 정착을 가로막는 요인은 경제적 요인보다 비경제적 제약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출산과 육아, 교육, 문화, 의료 등의 기반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이농의 유혹을 떨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농업과 농촌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확신하고 자신의 선택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가 달라져야 하고, 영농 활동에 쉽게 적응하고 기성 농업인들과 갈등을 빚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2만~3만 원씩 모아서 친목을 도모하는 개인 모임이든, 그보다 수십 수백 배의 구성원을 가진 농촌이든,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강물이 한 줄기 되어 유유히 흘러가듯 나아간다는 소월의 시구처럼 함께 어우러져야만 한다. “앞 강물 뒷 강물/ 흐르는 물은 /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그러나 그 중에는 신입 회원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가는 모임도 있다. 20년째 총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 오십에 무슨 막내노릇이냐고 투덜대는 구성원이 있다면 머지않아 흐지부지 될 공산이 크다.
60세 이상 농업인은 134만 명으로 전체 농가 인구의 절반 이상(55.3%) 이었다. 70세 이상은 3.2% 늘어난 반면, 60대 이하로는 모두 줄었다. 이대로라면 농가 인구가 200만 이하로 주저앉을 날이 10년이 채 걸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내친 김에 전국 가구 분포도 한번 살펴보자. 총 1984만 가구 중 수도권은 965만 가구(48.6%), 비수도권은 1019만 가구(51.4%)로 반반에 가깝다. 특별시와 광역시에 900만 가구(45.4%)가 사는 반면, 도 지역에는 1083만(51.4%)에 불과해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0~39세의 가임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인구 소멸 지수는 1.0 이하가 인구 쇠퇴의 시작을, 0.5 미만은 소멸 위험으로 분류하는데, 전남은 0.5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았으며, 22개 시군 중 78%인 17개소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니 출산율이 줄고 폐가와 폐교가 늘어나며 마트와 학원, 미장원 등 생활 편의 시설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반가운 것은 청년층의 유입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도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 추가 선발을 해야 할 만큼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전국의 40세 미만, 영농 경력 3년 이하의 청년 창업농 1200명을 선발해 월 100만 원까지 영농 정착 지원금을 3년간 지원하는 이 사업에 3326명이 지원하여 2.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여성 지원자가 577명으로 신청자의 17%가 넘고, 영농 경험이 없거나 1년차 농업인이 전체 지원자의 73,3%에 달해 도시 청년의 농촌 유입을 기대하게 한다는 것이다.
농촌에 영농 기반이 있는 부모를 가진 신청자가 67%에 달해 부모의 후광만 업고 영농 의사는 별반 없는 사람이 지원한다거나, 지원 자금 유용 등을 걱정하는 시선도 있으나,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면 청년 실업률을 낮출 성공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청년들의 농촌 정착을 가로막는 요인은 경제적 요인보다 비경제적 제약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출산과 육아, 교육, 문화, 의료 등의 기반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이농의 유혹을 떨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농업과 농촌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확신하고 자신의 선택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가 달라져야 하고, 영농 활동에 쉽게 적응하고 기성 농업인들과 갈등을 빚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2만~3만 원씩 모아서 친목을 도모하는 개인 모임이든, 그보다 수십 수백 배의 구성원을 가진 농촌이든,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강물이 한 줄기 되어 유유히 흘러가듯 나아간다는 소월의 시구처럼 함께 어우러져야만 한다. “앞 강물 뒷 강물/ 흐르는 물은 /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